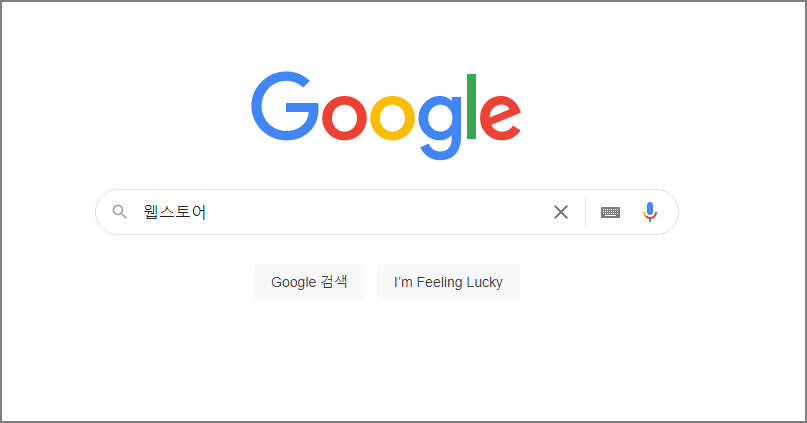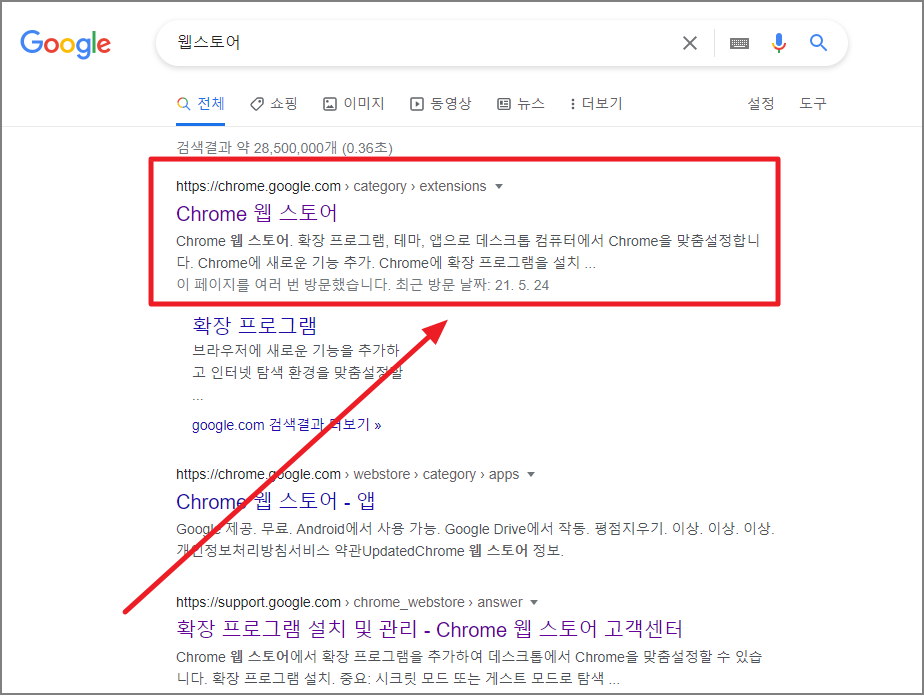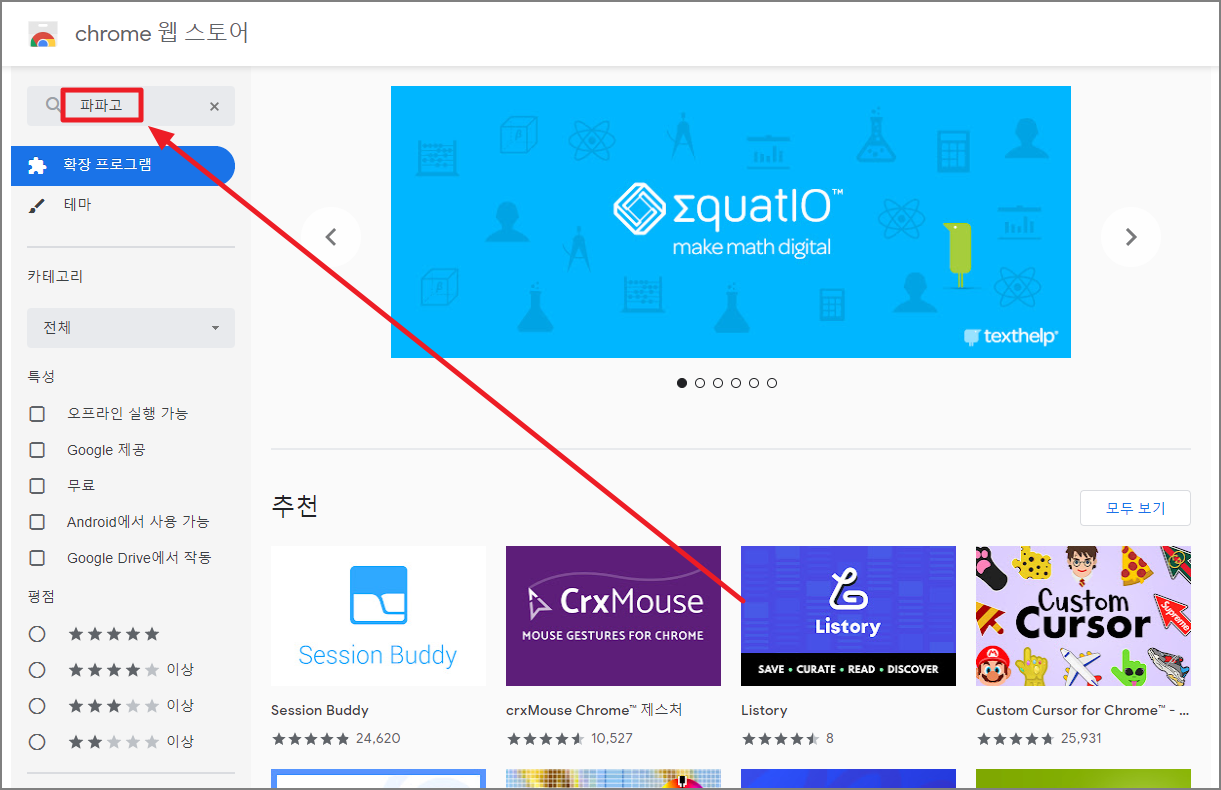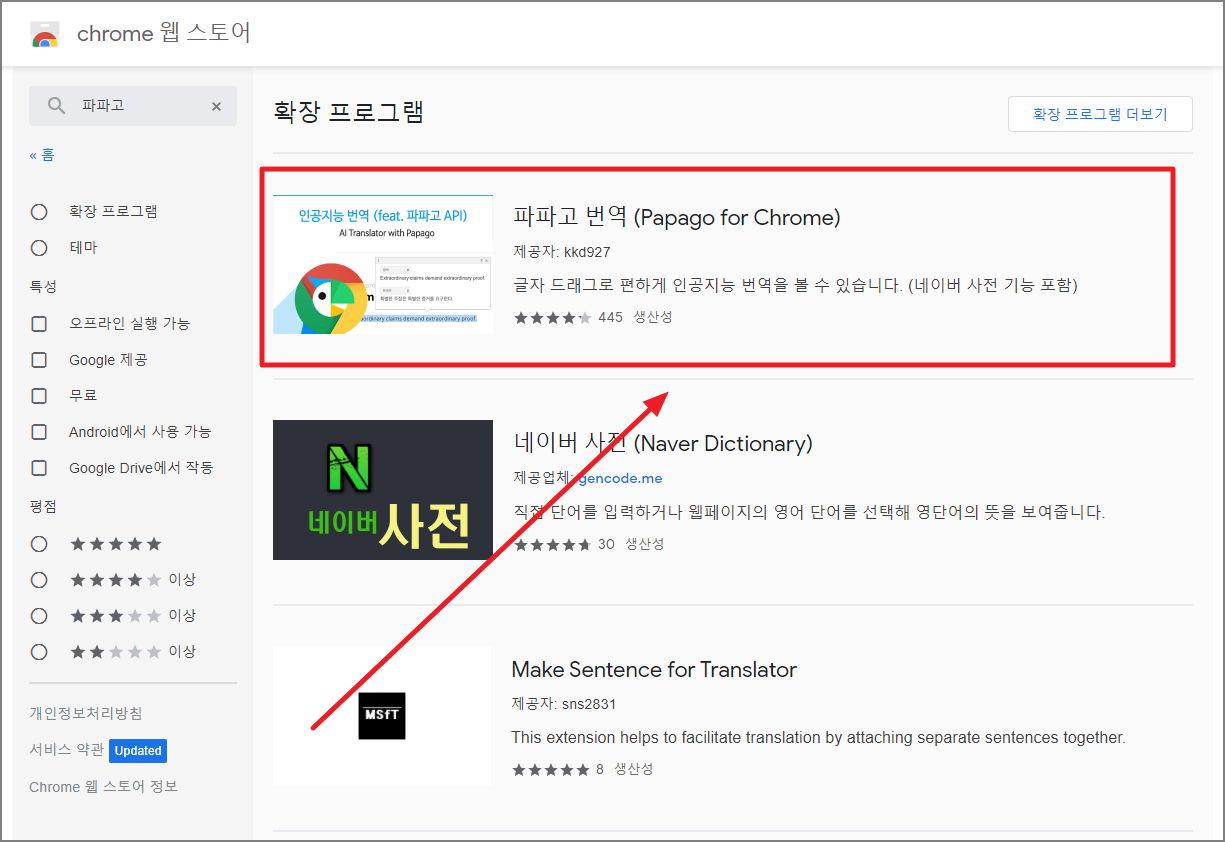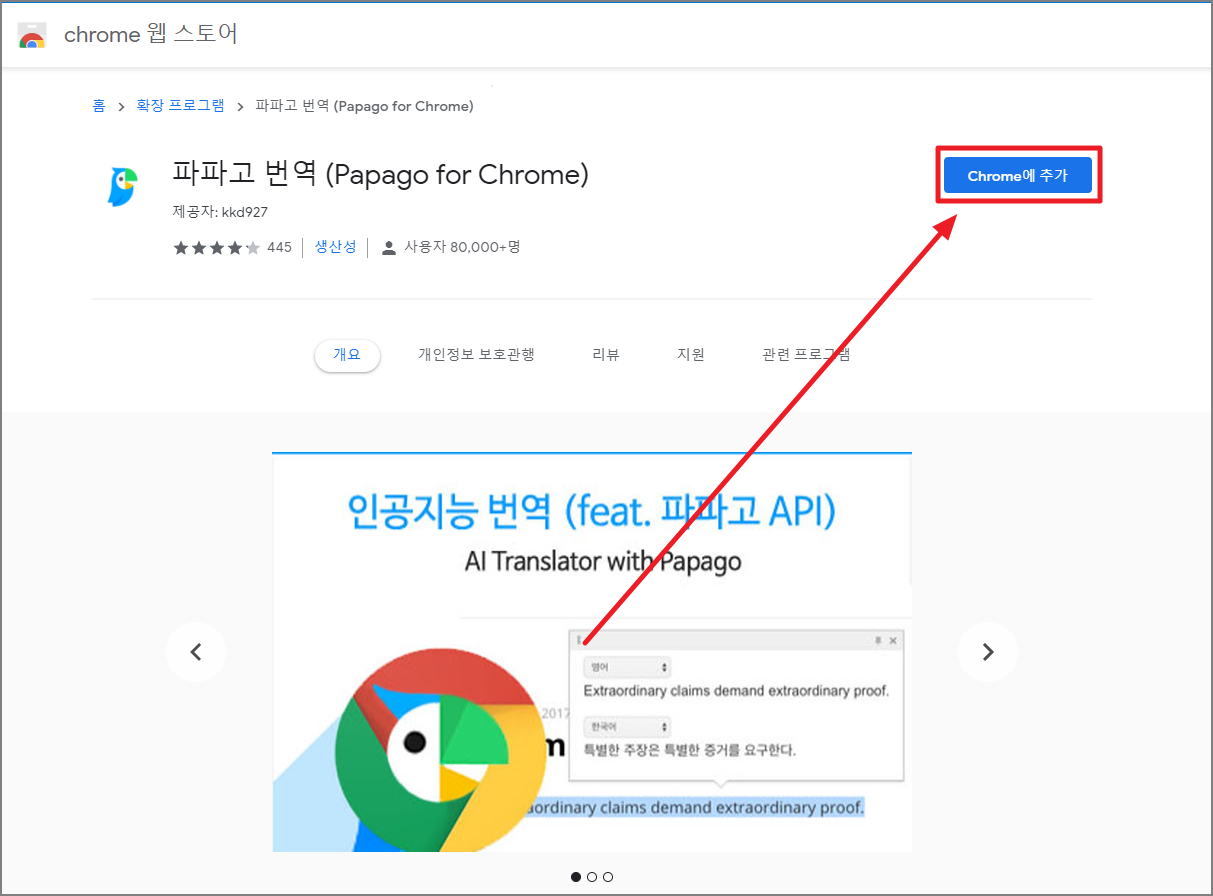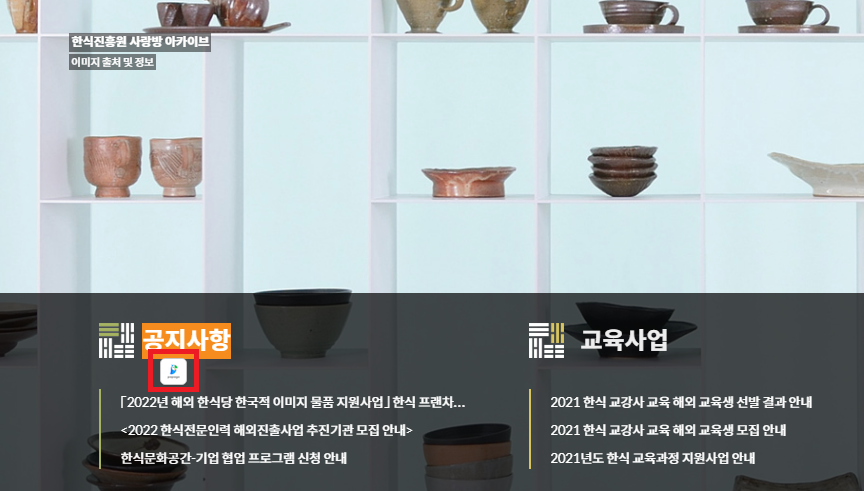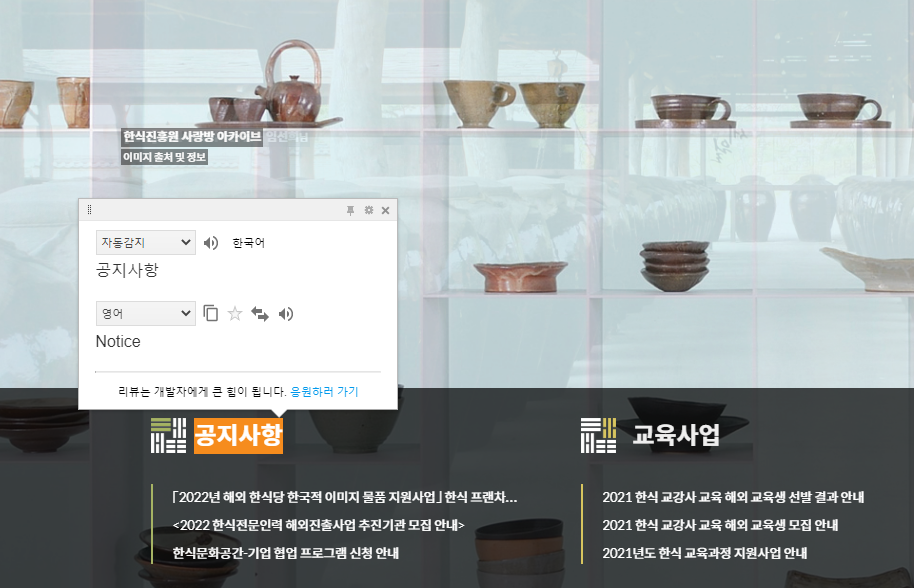한식 읽기 좋은 날
Vol 12. 화려한 미식의 고향, 전라북도
열악해도 끌리는 시간의 맛 <연남서식당>

그런데 이 식당, 언덕배기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대낮부터 손님들이 줄을 선다. 정식 영업시간은 오후 아홉시인데 보통 오후 여섯시면 고기가 다 떨어진다. 중국, 일본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손님은 왕’이라는 외식업 중력의 법칙을 한참 벗어나 있는 이 식당, 불편함의 끝이라 할 수 있는 이 가게는 왜 잘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것일까. 요리사 박찬일이 쓴 「백년식당」에는 연남서식당의 역사가 자세하게 그리고 맛깔나게 소개되어 있다.


서울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름
박찬일 셰프 말에 따르면 나이 지긋하신 현재 식당 사장의 아버지는 1953년 신촌에서 식당을 시작하셨다 한다. 말이 식당이지 현재 신촌 그랜드마트 뒤 편 무너져가는 한옥집 마당에 드럼통 몇 개와 군용천막을 세워놓고 장사를 했다. 현재로선 상상하기 힘들지만 번쩍번쩍한 신촌도 당시는 포탄이 떨어지는 불바다였다는 설명. 주인은 전쟁통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었다. 생계를 위해 열 살부터 어쩔 수 없이 가게 일을 도왔다. 주인의 아버지는 처음엔 오뎅, 돼지껍데기, 북어포에 잔술을 팔기 시작하다 나중엔 사람들 형편이 좀 좋아져서 소갈비를 시작했다. 그 땐 소갈비가 질겨서 다른 부위보다 월등하게 저렴했다고 한다.
무법천지인 세상에 무허가 가게였기에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 천막이 경찰들 군화발에 찢겼다. 사람들은 창업주가 김포사람이어서 ‘김포집’이라 불렀다.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영업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마음대로 ‘연남 식당’이라 등록을 했다. 그리고 손님들이 부르던 ‘서서 갈비’란 이름은 다른 사람이 먼저 상호등록을 해서 지금의 <연남서식당>이란 상호가 되었다. 이름 하나, 메뉴 하나에 전 후 서울의 역사가 담겨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스토리가 형식으로 고스란이 남아있다는 것. 벽돌로 쌓은 공터같은 공간, 연탄 드럼통 주변에 삼삼오오 서서 고기를 굽는다. 끼니도 때우기 어렵던 시절, 식당들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것이 당연했을 것이다. 밥, 국, 김치가 없는 것도 전쟁통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김치와 국을 만들 사람이 없어서 그때부터 쭉 없었다고 한다.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연남서식당은 그대로다. 지금은 사라진 선술집이란 장르의 적통을 온전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잇고 있다. 이런 비일상적 공간은 사람들에게 시간여행을 온 것 같은 특별한 기분을 선사한다.


고기 냄새만큼 깊은 여운
어차피 단일 메뉴라 “두 대요” “세 대요”라고 주문하면 개수만큼의 고깃덩이를 불판에 놓고 간다. 메뉴명은 소갈비지만 갈빗대에 안창살을 붙여놔서 아령 같은 모양이다. 고기에 밴 양념은 의외로 심심하다. 대신 마늘을 가득 넣은 간장 양념장을 주는데 이게 서식당의 핵심. 고기를 찍어 먹으면서 양념장과 연탄불을 머금은 고깃물이 섞이고 이 양념장이 다시 편마늘과 함께 연탄불에 쫄면서 마성의 양념장이 된다.

이 집에선 ‘소고기는 미디움 굽기’란 생각을 잠시 접어두자. 연탄불의 강한 화력으로 양념 고기 겉면을 강하게 구워 고소한 맛을 극대화한다. 불 위에서 고기가 좀 과하게 익는다 싶으면 앞선 마성의 양념장 안에 고기를 넣었다가 먹고 싶을 때 꺼내어 살짝 한 번 더 구워 먹는다. 갈빗대에 붙은 질긴 살은 작게 잘라 역시 바짝 구워 어금니에 놓고 씹으면 왜 나이 드신 분들이 뼈에 가까운 살이 맛있다고 하는지 알 수 있다.
연남 서서갈비의 성공신화에 힘입어 분점들이 생겼다. 본점에서 사사받은 분점들은 냉난방에 환기까지 완벽한 쾌적한 공간에서 밥과 국과 반찬까지 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본점에서 먹던 그 맛이 아니다. 연남서식당에 다녀오면 옷에 밴 고기 냄새 때문에 온 집 안에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지만 그 만큼 여운도 깊게 남는다. 이런 곳이 진정한 노포가 아닐까.
Where to Eat?
서울 신촌 맛집 _ 연남서식당
A 서울 마포구 백범로2길 32
T 02-716-2520
H 12:00-20:00
블로그 blog.naver.com/bitterpan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bitterpan_i
글·사진 한충희 명예기자(건강한食 서포터즈)

 한국어
한국어
 English
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