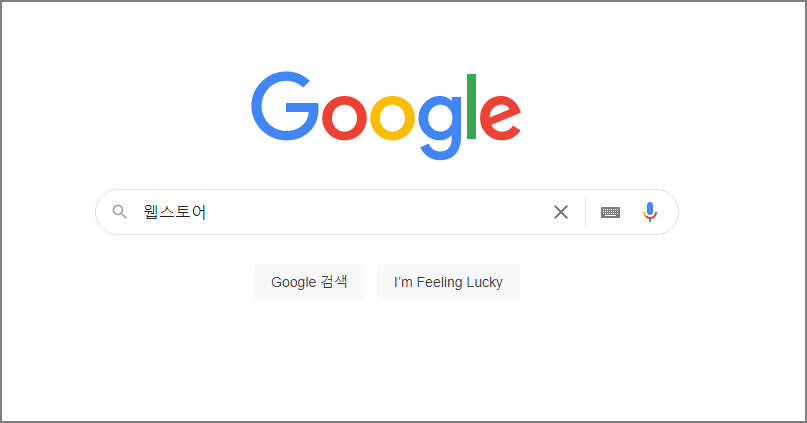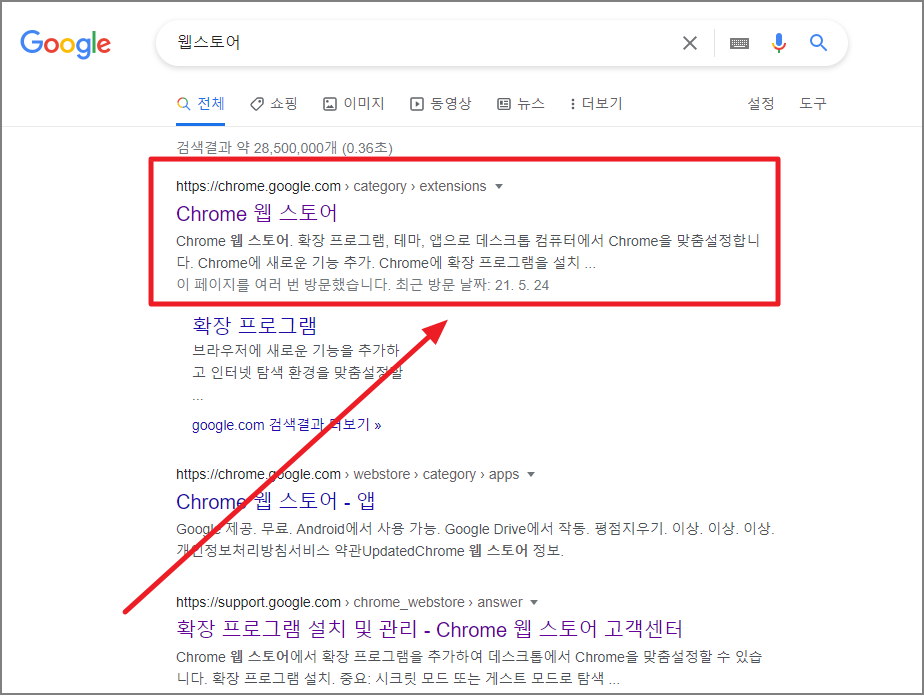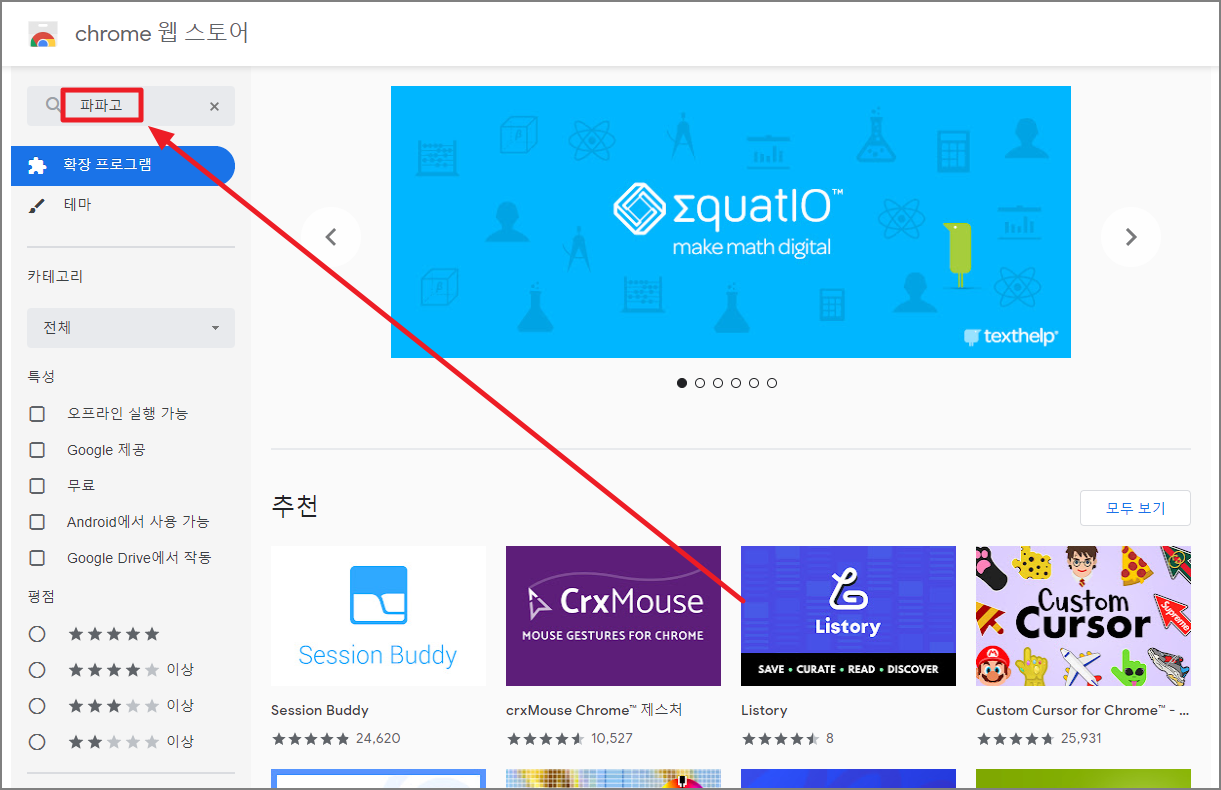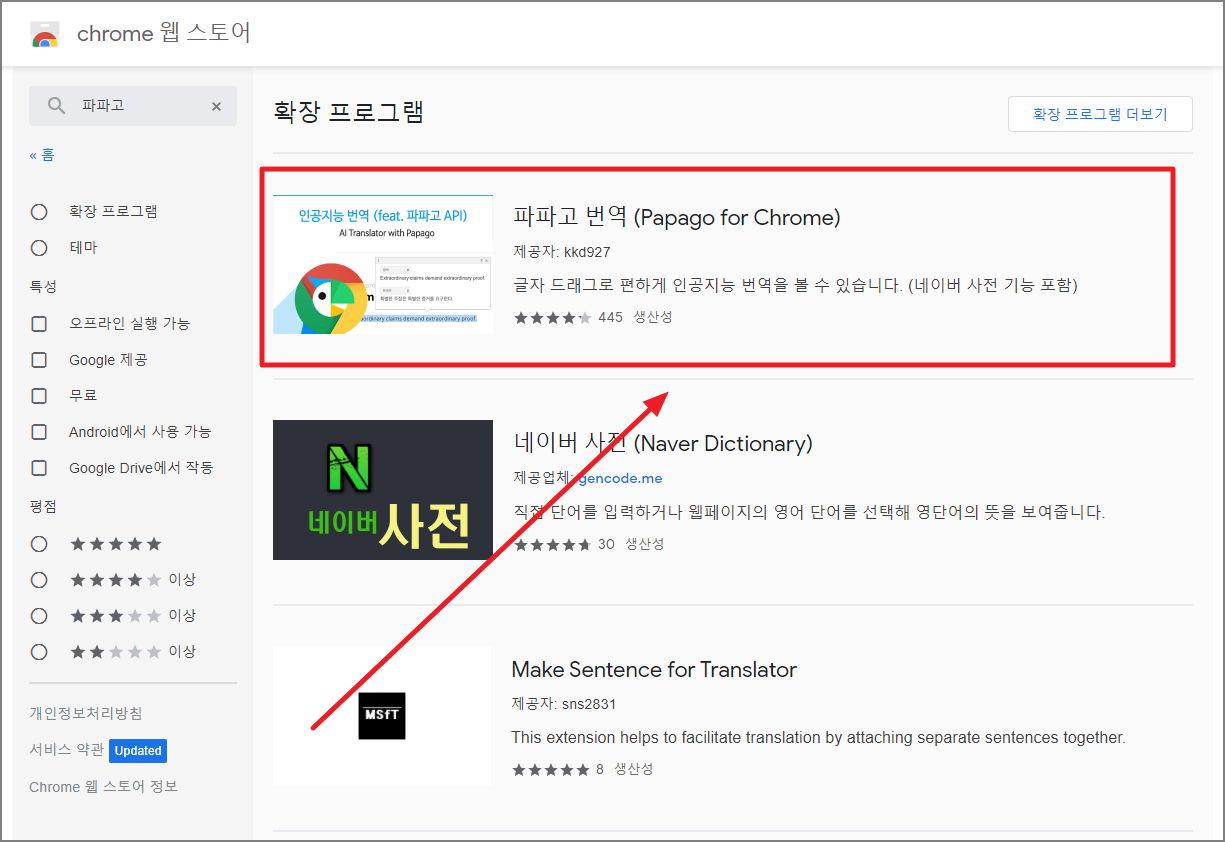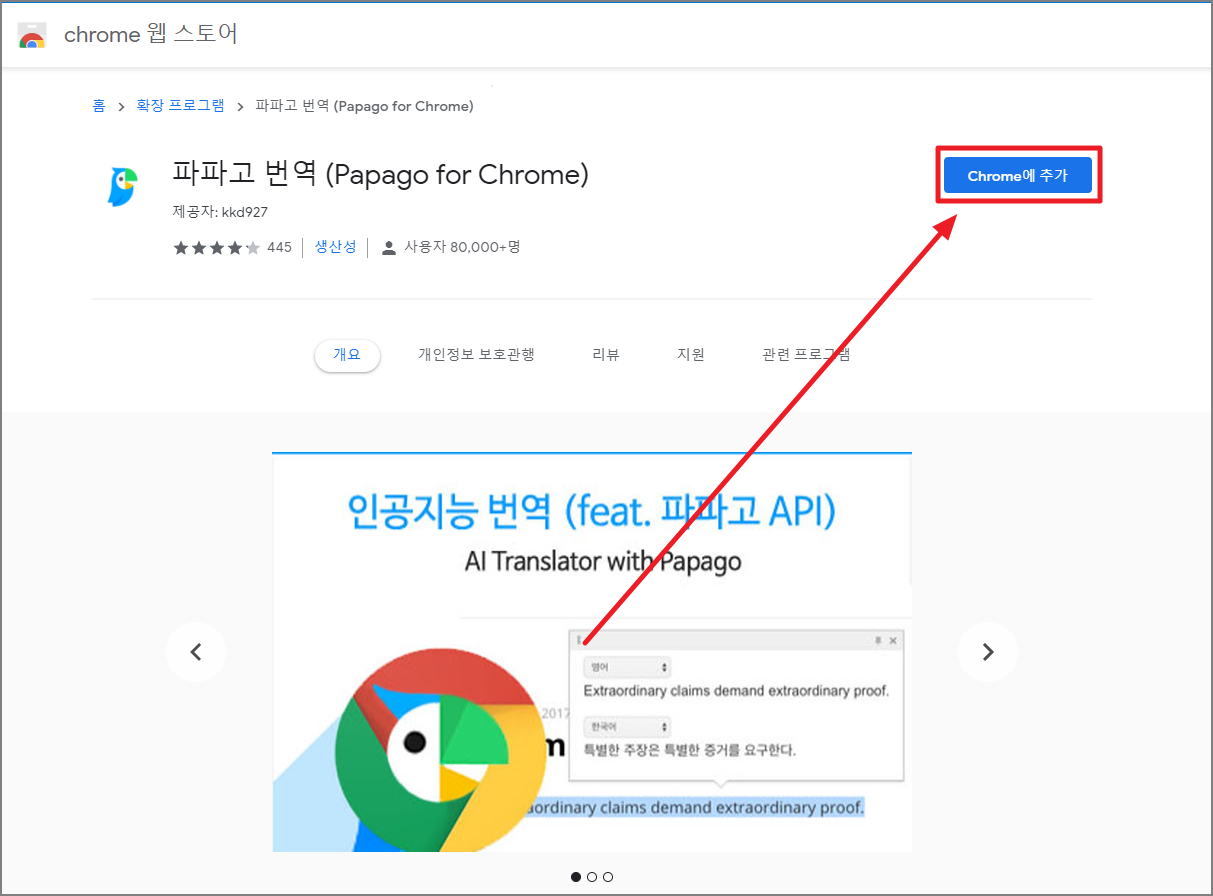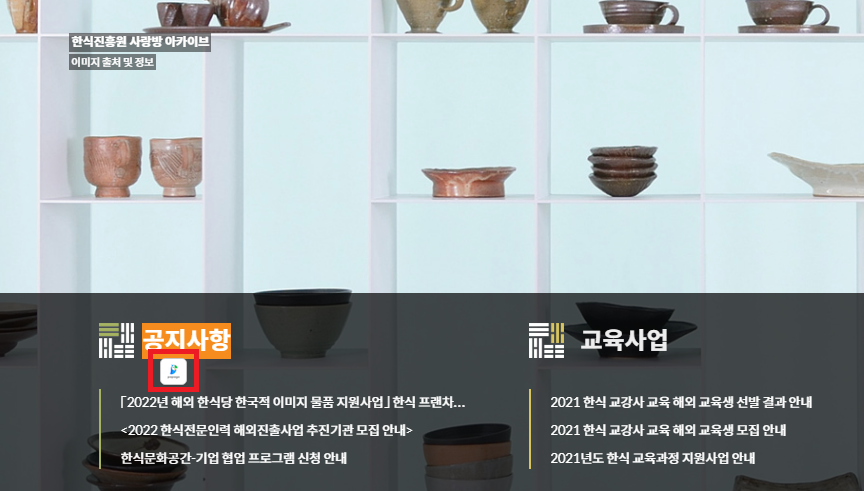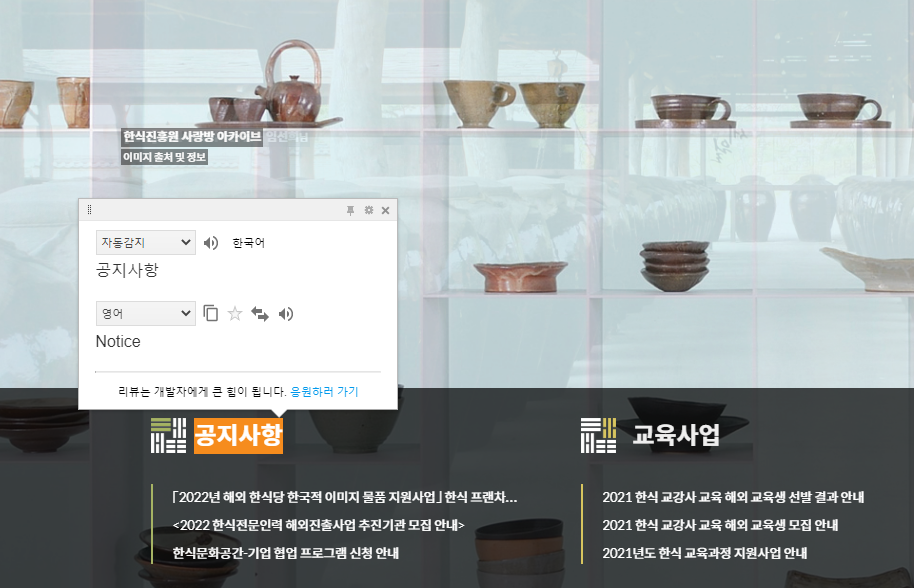한식 읽기 좋은 날
Vol 11. 대를 이어온 맛과 멋, 경상북도
대를 이어온 맛과 멋, 경상북도 ⑥
향토 미식 로드 _ 헛제삿밥
안동 유생들의 재치 헛제삿밥

헛제삿밥은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제사 음식처럼 차려 먹는 밥을 말한다. 쌀밥에 각종 나물을 얹어 집간장을 넣고 비벼 먹는 안동의 향토 음식이다. 귀한 쌀밥을 드러내놓고 먹지 못하던 시절, 서원 유생들이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축과 제문을 지어 헛제사를 지낸 후 그 음식을 먹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또 다른 설로는 늦게까지 글을 읽던 안동 유생들이 출출한 밤에 하인들에게 제사상을 차리게 했는데, 정작 제사는 지내지 않고 제삿밥만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고 하인들이 헛제삿밥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어느 쪽이든 안동 유생들의 재치가 넘치는 식탁이다.

유생들이 출출해진 밤에 하인들에게 제사상을 차리게 했는데
정작 제사는 지내지 않고 제삿밥만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고
하인들이 헛제삿밥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헛제삿밥 상차림은 실제 제사상에 올리는 쌀밥과 탕국, 전, 나물로 채워진다. 고사리, 묵나물, 도라지, 무채나물, 콩나물, 시금치 등 각종 나물을 올린 밥에 배추전, 다시마전, 호박전, 두부, 상어산적, 간고등어 등의 다양한 전과 탕국, 김치, 안동식혜를 곁들이는 한상차림이다. 일반적인 비빔밥과 다른 점은 고추장 대신 숙성이 잘된 간장으로 비벼 먹는다는 것이다.
헛제삿밥은 1976년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이 부근에 민속 관광지가 조성돼 본격적으로 상품화되었다. <맛 50년 헛제사밥>은 헛제삿밥을 가장 먼저 상품화한 조계행 할머니의 전통을 이어오는 곳이다. 현재는 조 할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은 방옥선 명인으로부터 조리법을 전수한 주인장이 운영하고 있다. 옛 방식 그대로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고 간장, 소금, 깨소금, 참기름 등 천연 조미료로만 맛을 내 깔끔하고 담백한 헛제삿밥을 선보인다.


헛제삿밥은 실제 제사상에 올리는 쌀밥과 탕국, 전, 나물로 채워진다
밥에는 나물을 올려 비벼먹는데 일반적인 비빔밥과 다른 점은
고추장 대신 숙성이 잘된 간장으로 비벼 먹는다는 것
안동 하면 누구나 쉽게 떠올리는 간고등어는 헛제삿밥에 오르는 주요 찬이다. 바다와 먼 내륙 지역인 안동에서 어떻게 바다 고등어가 명성을 얻은 것일까. 안동과 근접한 동해안 자락의 영덕, 강구항, 울진 등에서 고등어를 받으면 적당히 숙성된 상태로 안동에 도착하는데, 이때 소금 간을 하면 가장 맛있게 고등어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적당하게 쫄깃한 고등어 살점과 짭조름한 맛은 비빔밥과 더욱 잘 어울린다.
허구로 지낸 제사라고 해도 제삿밥답게 귀한 돔베기도 상에 오른다. 토막 고기를 가리키는 경상도 사투리인 돔베기는 토막 낸 상어고기를 말한다. 커다란 상어 고기를 제사상에 통째로 올릴 수 없으니 토막 내 염장하고 꼬치에 꿰어 제사상에 올렸다. 돔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몸에도 좋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물김치처럼 생긴 안동식혜 한 모금으로 마무리한다. 끓이지 않고 전통 발효시켜 만든 안동식혜는 일반적인 하얀색 식혜와는 달리 다홍빛을 띤다. 독특한 생강 맛, 고춧가루의 매운맛, 엿기름의 단맛, 무의 시원한 맛이 어우러진 유산균 음료다. 남녀노소 누구나 먹어도 속이 편안하다. 유생들은 첫닭이 울면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했는데, 이때 소화제를 먹듯이 안동식혜로 속을 달랬다고 한다. 음식으로 건강을 챙긴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Where to eat?
맛 50년 헛제사밥
A 경상북도 안동시 석주로 201
T 054-821-2944
H 10:30-21:30
글 이현경 사진 강현욱